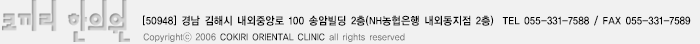요즘 면역 증강제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고려인삼은 조선 후기에도 동아시아 제국들이 공히 인정하는 최고의 약재였다. 조선 조정은 일본과의 인삼 밀무역을 엄격히 통제했다. 17세기에는 10근 이상 밀무역을 한 사람은 목을 벤다는 법령도 있었다. 그만큼 고려인삼의 약효가 컸다는 뜻이다.
일본 최고의 국민문학인 ‘주신구라(忠臣藏)’에는 다 죽어가던 사람이 고려인삼을 먹고 기사회생했는데, 인삼 값이 얼마나 비쌌던지 그 빚을 갚지 못해 목을 매 죽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인삼 먹고 목매다’는 일본 속담은 여기에서 비롯됐다. 1764년 일본인 사카우에 노보루는 “자체 인삼 재배에 성공했다”며 ‘조선인삼경작기’라는 책을 출간한다. 하지만 토질과 기후 조건이 맞지 않아 일본 인삼의 약효는 기대에 크게 못 미쳤고 고려인삼의 인기만 높아졌다. 고려인삼의 잎조차 약효가 좋다며 차로 마실 것을 권장했다.
그 때문일까. 옛 일본에선 더덕, 잔대, 도라지의 뿌리로 만든 가짜 고려인삼이 유행했다. 홍삼처럼 쪄서 말린 ‘숙삼(熟蔘)’을 약효가 없는 가짜 인삼이라고 의심하기도 했다. ‘해동역사’를 쓴 한치윤은 조선 강계 숙삼의 효능을 칭찬하며 “일본 사람들이 쪄서 만든 인삼을 약재로 쓸 수 없다 하니 참으로 우습다”고 했다.
숙삼의 효능과 제법은 고려시대의 기록에도 등장한다. 송나라 사신으로 고려를 다녀온 서긍은 자신이 쓴 책에서 “인삼은 생삼과 숙삼이 있는데, 생삼은 여름이 지나면 좀이 슬어 못 쓰기에 쪄서 오래 둘 수 있는 숙삼만 못하다”고 했다. 하지만 숙삼의 한 종류인 홍삼의 역사는 짧아 보인다. 정조는 “홍삼을 중국에 수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는 “삼의 빛깔은 본디 흰데 지금 붉다고 하는 것은 가짜로 만든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대신들을 추궁한다. 홍삼이 당시까지도 보편적으로 제조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홍삼의 기원은 다양하다. 중국 명-청 교체기, 청의 상인들이 사온 고려인삼을 명나라 사람들이 사지 않으려 하자 오래 보관하기 위해 삶아 건조했는데, 오히려 약효가 좋아져 더 많이 팔았다고 한다. 조선 순조 때 상인 임상옥의 기록에는 “백삼(白蔘) 한 움큼을 따뜻한 물에 적셨다가 온돌에서 말리면 색이 붉게 변한다”는 대목이 나온다.
약효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청나라 사신들의 기록을 묶어 쓴 ‘연행록선집’에도 어느 부분에선 “홍삼은 약의 힘이 백삼보다 조금 못하다. 조선은 오로지 백삼만을 사용하는데 중국은 백삼을 놓아두고 홍삼을 취택하니 그 뜻을 알 수 없다”고 쓰여 있지만 또 다른 곳엔 “백삼은 약의 성질이 조열(燥熱)하여 화평한 홍삼만 못하다”고 적고 있다.
홍삼은 인삼을 법제(法製)한 것이다. 법제 중에서도 물에 직접 삶지 않고 찌는 증법(蒸法)을 사용했는데 한 번 찌는 것과 아홉 번 찌고 말리는 방법이 있다. 인삼을 쪄서 맹렬한 기를 누그러뜨리고 그 효능을 부드럽게 하고 오래가게 만든 게 바로 홍삼이다. 물은 고요하며 아래로 흐른다. 인삼도 물로 찌면 물의 성질을 닮아 그 기운이 고요해진다. 인삼과 홍삼은 한국의 자연이 만든 영약임에 분명하지만 체질에 맞춰 복용해야 한다는 게 음양론적 진리다.
이상곤 갑산한의원 원장
동아일보 이상곤의 실록한의학